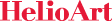[경향신문] 소마미술관 ‘누보 팝’ 展
- Date
- 2007-08-30 00:15
경향신문
소마미술관 ‘누보 팝’ 展
2007.08.30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 안영이 초나라를 방문하자 초 영왕(靈王)은 미리 준비한 죄수를 끌어오게 한 뒤 짐짓 시비를 걸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저는 제나라 사람인데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왕이 다시 안영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제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도둑들인가?” 안영이 대답했다. “회남(淮南)의 귤을 회북(淮北)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되어버립니다(南橘北枳). 본래 제나라 사람들은 도둑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데 초나라에 와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 이것은 초나라의 나쁜 풍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왕은 머쓱해져 그만 할 말을 잃었다. 회남의 귤이 회수를 건너 회북으로 가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생겨난 고사(古事)다. 그렇다면 미국의 팝아트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가면 무엇이 될까?
팝아트의 ‘팝’은 영어의 ‘포퓰러(popular)’가 어원이다. 말 그대로 통속적이며 대중적이었던 장르의 특성을 드러내는 솔직한 작명이다. 팝아트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 사용했던 사람은 영국 태생의 미술평론가 로렌스 앨러웨이(1926~90)였다. 그는 1950년대 런던의 비주류 예술가들 사이에서 팝아트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났다고 증언했지만, 어쨌거나 오늘날 우리가 흔히 팝아트라고 부르는 예술 형태가 완성된 곳은 50~60년대 미국이었다.
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는 산업생산의 확대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베이비붐 시대를 맞아 세계대전의 참화를 털어버리고 일찍이 역사상 유례가 없던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 인류 최초의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 왕성한 소비는 곧 사회적 미덕으로 치부되며 건강한 개인과 행복한 가정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소비의 대상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오늘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1956)’로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리처드 해밀턴은 “20세기에 도시생활을 하는 예술가는 대중문화의 소비자이며 잠재적으로는 대중문화에 대한 기여자일 수밖에 없다”며 재빠르게 달라진 바람의 방향을 읽어냈다. 팝아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유행이 마침내 예술계에도 불어닥친 것이었다. 공공연히 자신의 작업실을 아틀리에가 아닌 공장(factory)이라고 부르던 앤디 워홀은 “돈을 버는 것이 예술이며 일하는 것이 예술이다. 좋은 비즈니스는 최상의 예술이다”라며 자신의 ‘공장’에서 실크스크린으로 똑같은 작품을 찍어냈다.
세상은 바뀌어 있었고, 팝아트는 솔직한 예술이었다. 공장주 워홀은 “부르주아처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부르주아적인 것은 없다”면서 짐짓 잰체 우아와 고상을 부리는 예술가들과 그 대척점에 있던 이들을 모두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돈과 성공을 향한 욕망을 결코 숨기려 하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팝아트의 특성이었다.
이런 미국발(發) 유행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전후 미국은 유럽의 재건을 위해 마셜플랜으로 미화 120억달러를 지원했다. 유럽은 그 돈으로 파괴된 산업시설들을 재건하는 한편 엄청난 규모의 미국산 제품-자동차와 가전제품, 식품과 소비재들을 사들였다. 그렇게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흘러 들어간 목록 중에는 미국의 최신유행-팝아트도 있었다. 자,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흘러들어간 팝아트는 어떻게 달라질까, 귤이 회수를 건너 탱자가 되듯 팝아트도 신맛 대신 쓴맛을 내게 되었을까?
지금 서울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에서는 유럽 팝아트 ‘누보 팝(Les Nouveaux Pop)’ 전(展)이 열리고 있다. 누보 팝이라니, 생소한 이름이다. 주최 측에서는 흔히 미국 미술의 한 장르로 치부되는 미국 본토의 팝아트와 유럽 작가들에 의해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유럽 팝아트의 차별을 두기 위해 누보 팝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골랐다. 동명의 기획으로 작년 봄 파리 빌라 타마리스에서 개최되어 호평을 얻었던 전시를 서울로 옮겨온 이번 전시회에는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럽 7개국 1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미술관의 복잡한 전시장을 오르내리며 여러 작품들을 구경하는 것은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키득거리는 젊은 연인들을 구경하는 것만큼이나 재미난 일이었다. 좋든, 싫든 미국이 20세기 문화계에 남긴 흔적은 강력했다. 대서양 건너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 끝에서 북쪽의 스웨덴과 남쪽의 이탈리아까지, 사람들의 공통된 주제는 팝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웃고 있는 멀리 극동의 우리들까지.
아, 전시회를 즐기기 위한 작은 팁 한가지. 스페인 작가 안토니오 펠리페가 출품한 ‘코카콜라 소녀’는 화가 디에고 베라스케스의 1656년작 ‘흰 옷의 어린 왕녀 마르가리타 테레사’를 패러디한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라스케스의 오리지널이 현재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비엔나 미술사박물관전’에 전시 중이다. 오리지널과 그것에 대한 오마주, 두 작품이 모두 서울에서 전시 중이다. 유럽 현대 팝아티스트들의 재치와 유머가 돋보이는 재미난 전시회다. 결코 쓰지 않다.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1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입장료 6000원
〈이장현/ 문화에세이스트·‘클래식광, 그림을 읽다’ 저자 almaviva@empal.com〉